'인문학 가로지르기' 호평, 새롭게 만나는 날개의 '사연'들
"이 까치가 와서 둥지 튼 것이 이미 일곱 해나 됩니다. 그 새끼를 매년 올빼미가 잡아먹으니, 소리쳐 울기를 그치지 아니하여 슬픈 마음을 자아냈지요. 첫해에는 머리가 처음으로 희어지더니, 둘째 해에는 머리가 온통 희어지고, 세 해가 되자 몸이 온통 희어졌습지요. 금년에 요행히 그 재앙을 면하게 되자 꼬리가 점차 도로 검어졌답니다."
- 최자의 『보한집(補閑集)』 중에서
국문과 정민 교수가 선인들의 한시와 그림 속에 나타난 새 이야기를 책으로 담아 출간했다. 세 갈래의 내용으로 나뉘어 있는 『한시 속의 새, 그림 속의 새』에는 1백 70여 수의 한시와 1백 80여 컷의 그림이 실려있다. '새와 사람' 부분에서는 까치, 닭, 제비 등 우리 민족과 고락을 같이한 새를, '새와 그림'에서는 백로, 물총새, 딱따구리와 같은 옛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새를 이야기했으며, '새와 문화'에서는 소쩍새나 파랑새, 뻐꾸기, 직박구리와 같은 문화적 의미를 지닌 새를 다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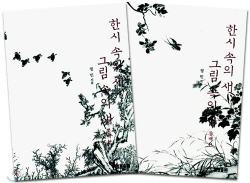 |
||
그간 조류학자들의 연구 저서와 새 그림에 관한 미술 학계의 서적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두 분야가 연계되어 연구된 사례가 없고, 한자문화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없어 옛 문헌과 그림 속의 새의 의미는 하나의 '암호'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 교수의 책은 문학과 회화, 조류학을 넘나들어 세 분야를 하나로 묶어내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한시와 조류학 분야를 연결시킨 참신한 시도를 '인문학 가로지르기'의 표본으로 평가하고 있다.
새 소리를 빌어 노래하는 금언체(禽言體) 한시를 공부하다가 새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정 교수는 한·중·일의 새에 관한 각종 서적을 사들이고, 세계의 새 그림 우표를 6백 장 넘게 모았다. 이러한 자료들로 수년 간 연구한 결과가 이 책에 녹아들기까지는 야생 조류 전문가와 애호가, 조류 사진작가, 전통회화 전문가 등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
자식 잃은 슬픔에 깃털이 하얗게 센 까치이야기, 죽은 지아비를 위해 절개를 지켜 원수를 갚고 죽은 열계(烈鷄)이야기, 울음소리를 본 따 조선의 제비는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야(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앎이다)'라며 '논어'를 읽을 줄 안다고 너스레를 떤 유몽인의 이야기 등 옛 문헌에 전해 내려오는 재미있는 새 이야기들이 구구절절 담겨 있다. 조선 선비들이 그 고고함을 닮고자 집에서 학을 기르며 춤을 가르쳤고, 18세기 서울에서는 비둘기와 앵무새를 애완용 조류로 키웠다는 흥미로운 사실들도 갈피를 넘기다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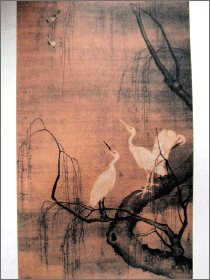 |
||
특히 선인들이 이광정의 '망양록'에 나온 본처의 자식을 버린 제비를 거울삼아 첩을 경계한 이야기나, 주세붕의 '의아기'에 전해지는 의리 있는 거위를 본보기로 삼아 자신들의 행태를 돌아보았다는 이야기가 눈에 띈다. 옛 사람들은 이런 새의 생태를 관찰하면서도 끊임없이 사람 사는 문제에 비춰 교훈을 얻고 스스로를 경계했던 것이다.
정 교수는 단아하고 정갈한 글로써 한문학의 저변 확대에 매진해온 학자로 널리 알려졌다. '한시 속의 새, 그림 속의 새'에서도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한시를 짧고 쉬운 문장으로 해설하고 있는 저자는 서문을 통해 '단지 한문으로 씌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옛글 속 무진장(無盡藏)의 콘텐츠가 방치되는 것이 참으로 슬프다'며 한문학에 대한 고루한 시선을 안타까워한다.
조류도감을 연상시킬 정도의 방대한 자료와 그에 어우러진 한시를 보면, 독자는 어느새 옛사람이 되어 그들 삶 속의 새를 바라보고 우리 인간을 돌아보게 된다. 선인들의 옛 글이 고운 단장을 하고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순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