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을 쓰는 소설가 편혜영 동문(국어국문학과 석·박사 과정)
| 누구나 한번쯤 자신을 상상의 세계로 빠지게 한 소설을 읽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흥미진진한 소설을 읽고 나면 작가에 대한 존경과 감탄이 우러나오는 법. 우리는 소설 속 세계를 창조하는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나 번뜩이는 감수성이 있을 것이라 추측하곤 한다. 하지만 편혜영 동문(국어국문학과 석‧박사 과정)은 실제 소설가는 흔히 상상하는 비범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한다. 우리를 소설 속 세계로 인도했던 편 동문이 소설가의 삶에 관해 이야기했다. |
소설은 세계의 축소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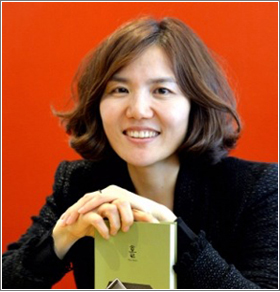 | ||
| ▲ 편혜영 동문(국어국문학과 석‧박사 과정)은 2000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서 <이슬털기>로 등 단해 현재까지 8편의 장편 소설과 소설집을 발간했 다. (출처: 서울신문) | ||
편혜영 동문은 2000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서 <이슬털기>로 등단해 <아오이 가든>, <저녁의 구애>, <홀> 등 총 8편의 장편 소설과 소설집을 발간했다. 소설집 <몬순>으로 2014년 제38회 이상문학상을 수상했고, 지난해 소설집 <소년이로>를 통해 2015 제60회 현대문학상을 거머쥐었다. 이 밖에도 수 차례의 수상을 통해 소설가로서의 역량을 인정 받은 그녀다. 편 동문 소설 특유의 기괴한 세계관은 독자로 하여금 작가가 창조한 낯선 세상에 단숨에 빠져들게 한다. 이것이 절정에 달한 소설 <아오이가든>에 대해 이광호 평론가는 “혐오스러운 이미지 속에서 기이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고 평하기도 했다.
이처럼 편 동문의 소설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차가운 문체와 잔혹한 묘사를 접한다. “저는 화자와 정서적으로 밀착돼 감정적으로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등장인물과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려 하죠. 이런 관찰자적인 시점을 견지하다 보니 차가운 느낌의 문체가 나오는 것 같아요.” 또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묘사를 중시해 필요한 경우 잔혹한 묘사를 곁들인다고 설명했다. 편 동문 소설의 또 다른 특징은 ‘모호함’이다. “사람이 사는 세계는 단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불확실한 세계를 표현하려다 보니 소설도 불분명하고 선명하지 않게 쓰여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야기가 하나의 주제의식으로 수렴되면 세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편 동문은 일상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감을 얻는다. 뉴스, TV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등 일상의 모든 매체가 소재의 원천이 된다. 지난 2005년 출간된 <아오이 가든>의 경우 홍콩에서 사스가 유행하던 당시, 감염자가 집단 발병한 홍콩의 ‘아모이 가든’ 아파트에서 영감을 얻었다. 실제로 아파트에는 폐쇄 명령이 내려졌고, 편 동문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소설을 썼다. 또 라디오에서 들은 사연과 같이 일상에서 접했던 이야기를 변형해 쓰기도 하고, 실제로 겪었던 일을 토대로 쓰기도 한다.
작가는 ‘몽상가’보다 ‘성실한 근로자’
편 동문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작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사람들은 주로 자유분방한 예술가이거나, 항상 고뇌에 찬 사색가로서 작가를 상상하곤 한다. 하지만 실제 작가의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고 했다. “작가라는 직업은 꾸준히 글을 써야 하기 때문에 성실하고 끈기가 있어야 해요.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몽상가’보단 ‘성실한 근로자’에 가깝죠.” 편 동문도 틈틈이 도서관, 조용한 카페 등을 찾아 글을 쓰곤 한다. 이야기를 상상할 때는 누구보다도 신나지만, 그 내용을 글로 쓰기 시작하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고민을 거듭한다.
힘들게 완성한 작품이라 편 동문은 “어느 하나를 뽑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작품에 애착이 간다”고 했다. “작가는 소설을 썼던 시기를 그 소설과 함께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어떤 작품이든 나름의 애정을 주게 돼요.” 하지만 자신에게 조금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작품은 <홀>이라고. <홀>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아내의 죽음을 맞이한 남자 주인공이 전신불구가 된 상황에서 장모의 병간호를 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소설이 잘 쓰여지지 않아 힘들었던 시기에 재미있게 써서 스스로 다음 작품을 쓰게 된 동력이 됐어요. 그래서 더 기억에 남죠.” <홀>은 <재와 빨강>과 함께 내년 미국에서 출간될 예정. 현재 번역 작업을 거치고 있다.
 | ||
| ▲ 편 동문은 지난해 11월 프랑스 생 나제르에서 개최된 문예축제 '미팅(MEETING)'에 참석해 '도시에서의 글쓰기'를 주제로 대담회를 진행했다. (출처: 한국문학번역원) | ||
의심을 이기며 계속 글을 쓴다
편 동문은 명지대학교 조교수이기도 하다. 작가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과 함께 소설을 쓰고 소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주된 교육 방식이다. “소설은 일방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와 감상자의 입장에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배워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편 동문도 학생들을 가르치며 느끼는 바가 많다. “학생들이 사회로 나가는 청년들의 출구가 막혀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인지 학생들이 쓴 소설에서 무기력한 느낌이 많이 들죠.” 학생들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면서 편 동문은 소설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소설을 쓰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편 동문은 소설을 쓰는 것보단 소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
편 동문은 작가를 꿈꾸는 이들에게 “‘글을 쓰고자 하는 열망’이 작가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전했다. “소설을 쓰는 것은 의무감에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글을 쓰고 싶다는 열망을 갖고 써야 하죠. 또 그 열망을 창작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성실성도 중요해요.” 소설을 쓰는 일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편 동문은 “계속해서 소설을 쓰는 게 목표”라고 했다. “소설을 계속 쓰다 보면 자기 검열도 심해지고 글을 쓰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의구심을 이기고 계속해서 소설을 쓰는 작가가 되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이에요.”
 | ||
| ▲ '믿고 읽는 작가'로 불리게 된 편 동문은 “계속해서 소설을 쓰는 게 유일한 목표”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 ||
글/ 최연재 기자 cyj0914@hanyang.ac.kr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한양위키' 키워드 보기
'한양위키' 키워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