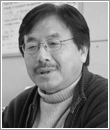"대중과 함께 숨 쉬는 국악오페라 만들고 싶다"
‘오페라’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무대가 생각이 나는가?
흔히 서양의 춤과 음악이 어우러진 공연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인식의 전환점을 맞이해도 될 것 같다. 순수 우리의 소리와 순수 우리의 춤으로 빚어낸 국악오페라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7일과 8일, 양일에 거쳐 고양 어울림누리에서 공연된 최초의 국악오페라 ‘한울춤’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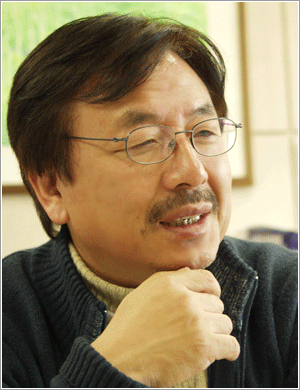 | ||
기존에 민족자긍심과 애국심에 초점을 맞춘 ‘민족오페라’ 성격의 공연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울춤’을 최초의 국악오페라로 얘기하는 까닭은 기존공연들이 우리 예술의 근본인 ‘악가무(樂歌舞)’ 형태에 기반을 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노래, 우리음악, 그리고 우리 춤으로 이루어진 국악오페라는 국악공연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호평을 받으며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위클리 한양에서는 국악오페라 ‘한울춤’의 대본과 작곡을 맡은 이종구(음대·작곡) 교수를 만나 그의 국악세계를 소개한다.
같이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음악, 국악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악을 국악기로 연주하는 민요나 판소리 등을 생각한다. 그렇다면 피아노로 연주되는 아리랑은 국악이 아닐까? 우리 땅의 작곡가들이 작곡한 곡도 국악이라 칭할 수 있을까? 음악의 범주를 감각이 아닌 말로서 규정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하지만 굳이 말로서 정해본다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적인 정서에서 곡이 쓰여 지고, 우리 것이라 공감 할 수 있는 음악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국악은 조선시대 이전의 음악입니다. 박물관에 악보가 보관되어 있을 법한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역동감과 빠른 템포를 가진 음악을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조선중대의 음악을 예로 들어 보자면 크게 세 가지 박자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만대엽(느린박자), 중대엽(중간박자), 삭대엽(빠른박자) 중에 결국은 가장 빠른 삭대협만 살아남게 됐죠. 음악이 시대적으로 감각적으로 변화한다는 소리입니다. 서양음악 또한 이러한 변화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국악을 재 정의한다면 우리정서에서 같이 즐기고 공유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언어의 선율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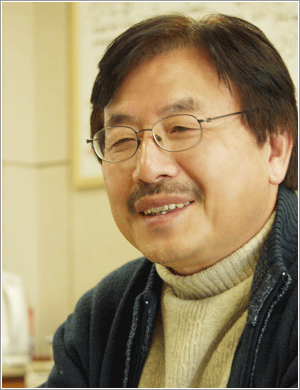 | ||
이 교수는 우리말, 우리언어를 어떻게 선율화 하는가를 자신의 연구의 화두로 삼고 있다. 언어에서 느껴지는 힘이 음악적으로는 선율로 표현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몇 해 전 국문과에서나 나올 법한 ‘음성학’ 논문을 발표하기도한 이 교수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 언어와 특성이 잘 드러난 음악으로 우리언어를 널리 퍼뜨리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는 우리 예술의 근본인 ‘악가무(樂歌舞)’를 잃어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가’라는 단어는 노래이자 언어를 말합니다. 우리 음악에서 ‘가’의 종류에는 시, 부(시를 음악처럼 읊어나가는 음악), 가 가있는데 여기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언어로 리듬을 표현한 것이 바로 국악입니다. ‘가’는 노래라는 말로 바꿔 부르기도 하는데 이 말은 ‘놀다’라는 말의 파생어 입니다. ‘악’은 기악으로서 악기로 리듬을 만드는 것이고 리듬을 사람의 몸으로 표현한 것을 ‘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각각 전문화, 분업화 되어있어서 ‘악가무’에 능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전문화됨에 따라 시야가 한정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한성준 통해 꺼지지 않는 민족 예술혼을 표현
이 교수가 무려 15년 동안이나 준비한 ‘한울춤’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한성준. 그는 근대적 전통춤과 소리의 지평을 연 예술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 “3000마디의 뼈가 움직여서 춤이 되느니라”라는 춤의 지론을 가진 그는 반만년 역사를 이어온 우리예술을 지켜야겠다는 일념으로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우리예술의 명맥을 이어나갔다. 그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유가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교수는 이렇게 답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당의 자식이자 관노였던 그가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한 민중운동가였다는 것입니다. 항상 북채를 손에 들고 다녔던 그는 동학농민운동에 참가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술가의 정당한 지위를 되찾겠다는 당찬 그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일제 강점기 때 일제의 혹독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평민들과 농기구를 두드리며 밥그릇을 두드리며 우리예술을 이어나가겠다던 그의 의지입니다. 탄압을 가하면 가할수록 더욱 찬란하게 꽃피우는 그의 예술혼을 이 공연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국악은 세계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문화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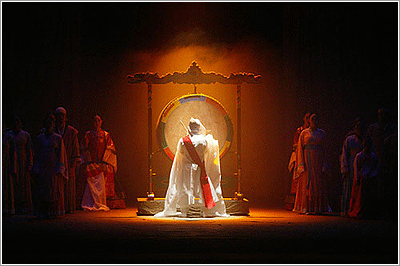 | ||
근대적 의미의 극장이 생기면서 ‘오페라’라는 단어가 생겨났다. 이 단어가 처음 만들어진 곳은 이탈리아다. 그래서 오페라 공연은 우리의 것이 아닌 서양의 공연이 국내로 유입된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에서도 가부키(가무극)이라는 이름으로 공연이 이뤄지고 있었다. 현재 쓰이고 있는 오페라 용어 중 ‘니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일어로서 ‘덧마루’를 의미한다. 공연장소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비슷한 형태로 존재한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극장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오페라가 공연되는 무대를 액자무대 극장이라 일컫는데 ‘오페라’라는 양식은 액자무대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양식을 말한다. 따라서 국악오페라는 국악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극장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연이라는 것이다. 내가 만든 공연이 많은 대중에게 사랑받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공연이 대중과 유리되고 예술이라는 고고한 탑을 쌓는 것은 공연이 자멸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예술성만을 주장하는 국악공연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고 더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이 국악오페라를 공유하는 것이 나의 바램이다. 국악오페라를 세계 사람들과 공유 할 수 있는 문화자산이라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수정 사진기자 feeler2020@ihanyang.ac.kr
학력 및 약력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