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유물에 새 생명 불어넣다
박물관의 모든 것 책임지는 큐레이터의 일과
'쉽지 않은 일이지만 관람객들 생각에 고된 줄 몰라'
우리는 어쩌면 이미 ‘여유’라는 말을 잊고 사는 건 아닐까. 많은 학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 구석구석도 돌아보지 못한 채 그저 수업시간에 맞춰 부리나케 뛰어다닐 뿐 주위를 둘러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서울캠퍼스 애지문을 나와 제 2공학관으로 달려갈 무렵, 늘 그 자리에 스쳐 흘러가는 풍경일 뿐이었던 박물관을 처음으로 들어가 본 감회가 매우 새로웠다.
 | ||
박물관 큐레이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걸까. 기자는 TV에서 나오듯 관람객들을 앞에서 작품설명을 해 주고 뿌듯해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봤다. 하지만 박물관 큐레이터인 이권호 씨의 설명은 전혀 다르다. “대학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 있게 한 가지 일만 하기보다는 박물관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책임져야 하죠”라며 이것저것 꺼내놓는 얘기들은 여유와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 씨의 일과는 전시실을 둘러보는 것부터 시작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물의 보존이기 때문에 전등 하나, 습도, 온도에도 소홀할 수 없다. 유리벽 안에 있는 습도·온도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꺼진 조명은 없는지, 혹 없어진 물건은 없는지, 시설물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유물보존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유리벽 안의 전구하나 바꾸는 것도 큐레이터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게 이 씨의 설명이다. 또 이 씨는 “오래된 그림이나, 목재로 된 유물의 경우는 특히 자외선과 습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전시물 사진 촬영 시는 반드시 플래시를 꺼 줄 것을 당부했다.
박물관의 재개관과 함께 수장고에서 잠자고 있던 수많은 유물들을 분류하는 작업 역시 예삿일이 아니었다. 지난 1979년 준공 이래 수많은 유물들을 발굴, 구입했지만 재개관 이전에는 수장고 안에 차곡차곡 모아둘 뿐이었다. 그 유물들을 분류하고 배열해서 지금과 같은 전시실을 꾸미는 것은 비단 자금과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보고 싶어 하는 이가 있다면 언제든 지하수장고에서 눈앞까지 가져다 줄 수 있게 되기까지는 큐레이터를 비롯한 박물관 직원들의 수많은 땀방울이 숨어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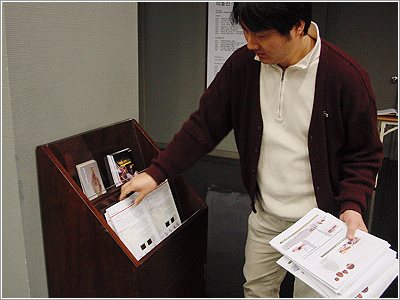 | ||
전시대에서 그 고고함을 자랑하고 있는 전시품들과는 달리 아직도 수많은 유물들은 전시되지 못하고 수장고에서 잠자고 있었다. 굳게 닫힌 시간의 통로와 같은 수장고 안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기자는 수장고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유물들의 규모에 한 번, 그리고 그 깔끔하게 정돈된 생명력에 또 한 번 놀랐다.
하지만 수장고가 협소해 임시로 만든 공간에 상자에 담긴 채로 보관되고 있는 유물들도 많았고 그나마 수장고 내부의 유물들마저 습도 유지시설 부족으로 보존에 애를 먹고 있었다. 다행히 박물관 큐레이터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해 매년 2회 이상씩 전시회를 개최하고 유물 보존에 힘쓰고는 있지만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지원 등 학교의 관심이 절실해 보였다. 그럼에도 이 씨는 “우리가 고생하는 만큼 많은 이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라며 만족감을 표했다.
오는 5월에는 지난해에 이어 개교기념 전시회가 다시 한 번 열릴 예정이다. 박물관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본 기자처럼 정신없이 바쁘기만 한 한양인이 있다면, 혹시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 토기를 직접 만져볼 것을 권하고 싶다. 한번쯤은 옛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박물관 큐레이터들의 손길을 닮아보는 게 어떨까.
변 휘 학생기자 hynews69@ihanyang.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