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의 필수조건, '독서'
박기수 교수와 이훈 교수가 전하는 책 이야기
인간의 삶을 재통찰 할 좋은 기회
지식의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 그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현대의 지식인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학생들이 진정한 지식인이기 위해서는 많은 필요조건들을 요하지만 그중에서도 독서는 특히 불가분의 요소라고 하겠다. 이제 갓 대학에 몸담은 06학번 새내기들은 지식인이 되기 위한 도약을 시작했다. 그 도약을 훨씬 가능성있는 모습으로 만들고자 위클리한양에서는 몇 권의 책을 추천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순서로 박기수(국문대·문화콘텐츠) 교수와 이훈(사회대·관광) 교수가 새내기들을 위해 전하는 두 권의 책 이야기를 들어봤다.
벼린 산문의 순결 - 칼의 노래
김훈은 깡마른 샤먼이다. 시리도록 파랗게 벼린 언어의 작두 위에서 그는 뛰어 거침없이 뛰어오르고, 정확히 올라간 높이만큼 내려서는 굿을 벌인다. 은유의 아름다움과 현상학적 환원을 바탕으로 하는 그의 레토릭은 완과 급을 조절하며 읽는 이를 가파르게 몰아간다. 그의 글은 지금 이곳의 사내들이 잃고 있는 억센 완력과 뜨거운 생명으로 난장이 되고 만다. 그 난장의 생명은 산문의 휘황함으로 빛나는데, 그 빛의 중심에 깡마른 샤먼 김훈이 있다.
 | ||
산문이 살아 있는 시대는 아직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다. 산문은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탐색과 팽팽한 긴장으로 자신의 몫을 지켜가기 때문이다. 기형적인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가 잃은 가장 뼈아픈 것의 하나가 바로 이 산문이다. 그 결과, 우리는 지성의 사유나 세계에 대한 통찰 그리고 결코 타협하지 않는 꼿꼿한 정신을 글에서 잃었다. 그러한 산문이 김훈의 글쓰기를 통해 복원되고 있다. 김훈의 글쓰기는 특정 장르에 구애됨이 없이 종과 횡으로 달린다. 그가 이전에 보여줬던 미학적인 혜안이 빛나던 문학평론은 물론 두 개의 은륜 사이를 달리며 몸으로 써내려간 여행 산문(자전거 여행)과 현실에 대한 물러서지 않는 정신을 촌철살인의 언설로 일구어낸 세설(아들아, 다시는 평발을 내밀지 마라) 그리고 남성서사의 예를 보여주는 소설(칼의 노래) 등이 그것이다. 세 권 모두 김훈 산문의 미덕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특히 ‘칼의 노래’는 신열을 앓듯이 읽히는 작품이다.
김훈의 ‘칼의 노래’는 두 가지 방향에서 즐길 수 있다. 하나는 이순신의 인간적인 내면을 엿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김훈의 산문으로서 즐기는 것이다. ‘칼의 노래’는 이광수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나 박정희의 군국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확대 재생산된 성웅 이순신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이순신을 탐색하고 있다. 왕과 권력층의 견제에 의한 억울한 옥살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전장으로 향해야하는 아들의 슬픔, 자신의 피와 땀으로 일군 수군이 전멸한 상태에서 거대한 적의 수군과 맞서야하는 절망감, 부하들을 먹이지 못하는 지휘관의 무력감, 온 천지에 널린 주검과 굶주림과 적의 칼날 사이에서 대면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간 이순신을 작가는 복원하고 있다.
이 작품은 사실적인 묘사와 시적이면서도 단호한 작가의 호흡을 통해 읽는 이를 굶주림과 주검으로 넘실대는 남해의 전장으로 끌고 들어간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칼의 노래’의 또 다른 미덕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은 그토록 끔직하고 섬뜩한 현장 속에서 작가의 현실과 인간에 대한 통찰을 미학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김훈의 산문 곳곳에서 보이던 향기롭고 찬란한 통찰들이 아름다운 문장으로 살을 얻고, 이순신의 사적(史籍)으로 뼈대를 세워 살아난 것이 바로 ‘칼의 노래’인 것이다.
‘칼의 노래’로 이순신은 자유로워졌다. 독재자의 지배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역사속의 인물로 그가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김훈의 산문정신을 통해서였다. 오늘 우린 ‘칼의 노래’에서 단순하고 순결했던 한 무장의 칼과 단호하고 꼿꼿한 한 산문가의 고뇌와 통찰을 발견할 수 있다.
박기수(국문대·문화콘텐츠)교수
인간은 놀이를 한다 - 호모루덴스
논다는 것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무의미 하거나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차적 행동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진지하게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것은 노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귀한 행동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놀이(play)는 문화보다 오래된 것이다”로 시작하는 호이징하가 쓴 ‘호모루덴스’는 놀이가 인간의 행동과 본질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의미의 순수한 놀이가 문명의 주된 기초 중의 하나”이며,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차별화 된 가장 큰 특징이 진정한 놀이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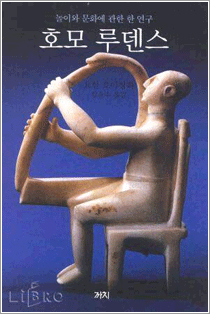 | ||
호이징하는 인간의 역사, 문화, 현상을 분석하면서 우리의 거의 모든 것들이 놀이적 규칙과 법칙을 따르고 있으며 그 안에는 놀이적 요소를 포함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놀이와 법, 놀이와 시, 놀이와 전쟁, 현대문명과 놀이 등에 대한 그의 통찰적 해석은 우리문화와 삶이 노동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놀이에 의해 구성된 것임을 규명해 낸다.
잘 논다는 것은 개인적 만족과 행복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산업적 가치를 가진다. 요즘 유행하는 한류문화의 현상은 노래, 드라마,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관련된다. 즉, 우리정서를 가진 놀이가 대중의 차원으로 확산되고 이것이 전문성과 결합해 상업적 성공과 문화현상으로 전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놀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은 현재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광산업, 여가산업을 형성하며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 미래적 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호이징하의 ‘호모루덴스’를 읽는 것은 인간으로서 우리를 이해하는 방법이며, 놀이산업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귀중한 지침이 될 것이다.
이훈(사회대·관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