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 음악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을 들으며 바흐를 소리 느끼기를"
메트로놈이라는 작은 기계가 있다.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접해봤을 법한 것으로 안단테, 모데라토, 알레그로 등 음악에 속도에 따라 추를 조정해 주면 똑딱똑딱 하는 소리가 제각기 다른 빠르기로 울린다. 박자 역시 조절이 가능해 맞춰놓은 박자마다 벨이 울리곤 하는 이 기계는 음악가 베토벤이 귀가 멀자 그의 주치의이자 친구인 멜젤이 그를 위해 발명한 것이라고 한다. 박자를 놓치지 않게 해 주는 기계, 메트로놈처럼 현대음악의 낭만성에 빠져 있는 대중들에게 ‘오선의 룰’을 환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음악가가 있다. 본교 음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강해근(음대·관현악과) 교수. 그는 “달콤하기만 한 요즘 연주에 질렸다면, 옛 음악이 들려주는 소박함에 귀를 기울여 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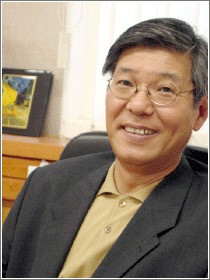 | ||
강 교수는 ‘정격연주’로 유명하다. 정격연주란 한 마디로 격식에 맞게 하는 연주를 말한다. 음악을 작곡 당대의 악기와 연주방식으로 해체·복원해 당대의 정신을 다시 엿보겠다는 것이다. 지난 03년 ‘옛 음악 예스런 연주 시리즈’라는 이름의 정격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정격연주 연구에 힘을 쏟아온 강 교수. 그는 “바흐는 바흐답게 연주하라”고 이야기한다. 과거의 시대정신이 숨 쉬는 고전을 오늘의 낭만으로 재현하려다 보니, 그 음악이 본래의 빛을 바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자신이 기획한 정격연주회에 대해 강 교수는 “극히 짧은 우리나라의 정격연주 역사에도 불구하고 청중 및 여러 국외 연주자들이 기대 이상으로 좋은 반응을 보여줘 뿌듯하다”고 밝혔다.
국내 음악계에서는 정격연주에 대한 관심과 역사가 그다지 깊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격연주를 주창하는 음악가들이 서두르는 법은 절대로 없다. 정격연주에는 단순히 음악적 기술이 아닌 ‘지식’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에 정격연주를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말한다. 요즘 들어 정격연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육계에서 정격연주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드물다고 이야기하는 강 교수. 그는 “해외 유수의 음악교육기관들은 정격연주를 이미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며 “정격연주에는 단순한 음악적 지식이 아니라 시대를 넘나드는 음악사적 식견과 넓은 지식이 필수”라고 이야기한다.
바흐의 마테수난곡을 가장 좋아한다는 강 교수는 첼리스트다. 첼로는 바이올린이나 비올라와 같은 다른 현악기에 비해 인성(人聲)에 매우 가까운 음역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쉽게 말해 표현력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첼로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으로 강 교수는 중후한 음색을 꼽는다. 대학시절 첼로를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 연주자보다는 교육자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강 교수. 이후 그는 고전의 고향인 독일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음악을 공부했다. 훌륭한 연주가의 조건을 묻는 질문에 그는 “자신의 교양과 음악적 소양, 품성 등이 결국 훌륭한 연주의 바탕이 된다”고 말한다.
강 교수는 “음악을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음악에 있어서 악기를 다루는 기술적 부분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은 오선상의 메시지를 재현하는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생각. 그는 “기술을 통해 정작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연주자 내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을 들으며 카라얀의 인상적인 지휘를 떠올리는 대신 소리의 이면에 있는 바흐를 찾아보는 작업. 그것이 정격연주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이야기이다.
구은진 학생기자 eithelf@hanyang.ac.kr
학력 및 약력
 | ||
강해근 교수는 1947년 전라북도에서 태어났다. 집안이 일찍부터 개화된 내력이 있어 어릴 적부터 집 다락에 있던 오래된 악기들을 꺼내 놀았던 기억으로 자신의 유년시절을 소개한다. 이후 학교에 있던 풍금을 쳐 본 기억이 유년시절 악기와 가진 인연의 전부라고. 전주에서 인문계 고교에 진학한 후 음악부에서 활동을 시작한 것이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가 됐다는 소박한 고백도 숨기지 않는다. 1973년 서울대 기악과를 졸업하고, 1977년 독일 뮌헨루드비히막시밀리안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R. Strauss음악원을 거쳐 현재 관현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음악연구소 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