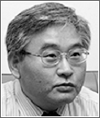자연을 사랑하는 공학자
"자연 거스르는 개발엔 오염과 파괴가 뒤따르기 마련"
현재 세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솟은 우리나라도 ‘전국토가 공사중’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개발에 열을 올린 때가 있었다. 산과 강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했던 대한민국은 어느새 회색빛으로 물들어갔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갔고 편한 생활이 뒤따랐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컸다. 울창한 숲을 이루던 산은 점차 민둥산으로 보기 흉한 속살을 드러냈고 강과 하천은 오염으로 찌들어갔다. 앞만 보고 달린 결과 였을까. 생활의 안위를 위한 수단이었지만 결국 되돌아온 결과는 숨쉴 수 없이 황폐한 도시였다. 여기 황폐한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 자연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사람이 있다. 본교 김선준(공과대· 지구환경시스템) 교수가 그 주인공. 김 교수는 “자연을 거스르는 개발엔 오염과 파괴가 뒤따르기 마련”이라고 경고한다.
 | ||
환경문제에 조예가 깊은 김 교수는 죽은 환경에 숨을 불어넣는 자연의 명의(名醫)이기도 하다. 잿빛 탄광촌을 푸른마을로 만드는 마법같은 방안이 담긴 ‘미생물을 이용한 산화공물 처리법’을 개발한 것이다. 김 교수는 광산개발로 인해 강한 산성으로 변한 탄광촌의 하천을 되살릴 방안에 골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탄광의 방류수 처리를 위해 외국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았다. 이에 김 교수의 연구팀은 이를 개선할 방안을 찾는데 주력했고 결국 우리에게 맞는 시스템을 개발해 낼 수 있었다.
이렇듯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공학적으로 풀어가는 김 교수는 지난 2001년 새만금 간척사업의 시국선언자이기도 하다. 그가 환경문제와 관련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와 인식의 전환. 환경문제가 발생했을 시 지역주민과 정부, 학계와 시민단체가 토론을 통해 타협점을 찾는 영국을 예로 든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아 환경분쟁은 어느 편이 이기는가에 대한 문제로 비화된다”고 지적한다. 결국 자연보호는 국민의 도덕심과 인식의 문제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사람들 누구나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생활화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실생활에서 자연 보호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동료들이 한 번쯤을 접해봤을 골프를 치지 않는 것. 이는 환경을 연구하는 학자로서의 책임감 때문이다. 김 교수는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에 골프장을 만들 경우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람들에게 골프장을 짓지 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나는 앞으로도 골프를 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학자로서의 소신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환경을 연구하는 학자이기 이전에 교단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역할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제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가장 큰 성취감을 느낀다고 한다. 어렵고 눈에 띄지 않는 분야를 옹골찬 집념으로 연구하는 김 교수와 그런 그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 있기에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상희 학생기자 hasang@hanyang.ac.kr
| 학력 및 약력
김선준(공과대·지구환경시스템) 교수는 1980년 서울대 자원공학과를 졸업 후 82년에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87년에 미국 퍼듀대학에서 자원공학과 박사학위 취득 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92년 2월까지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현재 한국암석학회, 한국지질학과, 토양지하수학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국외 25편, 국내 40여 편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