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표준에 도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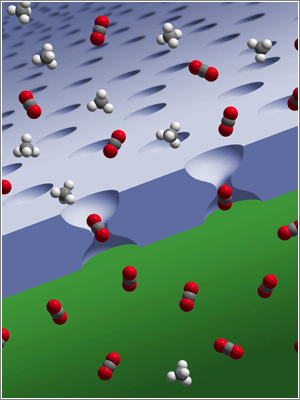 연구 성과는 지난 12일 사이언스지에 논문이 실리면서 국내에 알려졌다. 이 교수 연구팀은 기존 플라스틱 소재보다 이산화탄소 분리 성능이 500배나 향상된 소재를 개발했다. 이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플라스틱 소재는 쉽게 말해 고효율의 이산화탄소 분리막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통과시켜 포집 및 분리하는 원리다. 이 교수는 “기존 플라스틱 소재보다 이산화탄소 투과 속도가 획기적으로 빠르다”며 “그 만큼 처리 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플라스틱 막 면적을 500배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밝혔다.
연구 성과는 지난 12일 사이언스지에 논문이 실리면서 국내에 알려졌다. 이 교수 연구팀은 기존 플라스틱 소재보다 이산화탄소 분리 성능이 500배나 향상된 소재를 개발했다. 이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플라스틱 소재는 쉽게 말해 고효율의 이산화탄소 분리막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통과시켜 포집 및 분리하는 원리다. 이 교수는 “기존 플라스틱 소재보다 이산화탄소 투과 속도가 획기적으로 빠르다”며 “그 만큼 처리 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플라스틱 막 면적을 500배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밝혔다.이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플라스틱 소재는 향후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구온난화 및 기후 변화를 논의하는 제 13차 당사국총회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이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기술로 채택이 확실시되는 시점이라 더욱 기대가 크다. 이 교수는 “총회에서 새로운 플라스틱 소재가 채택되면 표준화 기술이 되는 것”이라며 “이후에는 다른 나라들도 우리 기술을 상용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뿐만 아니다. 천연가스가 지니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으며 적절한 화학 처리 후에는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에도 응용할 수 있다. 또한 해수담수용 막으로도 쓰일 수 있는데, 이는 해수의 소금을 걸러내 물만 통과시켜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기술이다.
기술을 실용화 하려면 아직 과제가 남아있다. 현재 이 교수팀의 플라스틱 소재는 평면 형태의 막인데, 차후에는 실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즉, 접촉면적을 더욱 늘려 부피는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 교수는 “2013년 이후 한국은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감축 문제가 시급한 시점”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이번에 개발한 플라스틱 소재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라스틱을 이용한 분리막 기술은 플라스틱이 기체, 액체, 이온 등에 대해 다른 투과 속도를 가진다는 원리를 기본으로 한다. 이러한 속성을 이용하면 각 혼합물에서 중요한 성분을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기존의 ‘분리공정기술’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적으며, 친환경 기술의 하나로서 전 세계적으로 관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낮은 분리 효율과 고온 및 고압 공정에서의 불안정성이 해결해야 할 숙제였다. 이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플라스틱소재는 우수한 내열성을 가지고 있어 화력발전소와 같은 고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분리에 적용이 가능하다. 즉, 플라스틱 분리막 소재의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던 분리 성능의 한계를 획기적으로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번 연구 성과는 본교 출신으로 구성한 연구진이 이루어낸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책임저자인 이 교수를 비롯해 주저자 박호범(화학 96년 졸) 동문, 제 2저자 정철호(공과대·화학 박사과정) 군 등이 4년 동안 연구를 진행했다. 본교 교수와 학생만으로 구성된 연구팀의 논문이 사이언스지에 실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군은 “연구하는 동안 보완할 점이 많아 시간도 많이 소요됐고 실패도 많이 겪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교수는 “한양의 이름을 걸고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실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성과”라며 기쁨을 전했다.
나원식 학생기자 setisoul@hanyang.ac.kr
사진제공 : 분리막 연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