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애 가장 행복했던 일주일"

‘하루 길의 숲을 지나가려면 일주일 분의 식량을 가져가라’는 체코 속담이 있다. 위클리한양에선 ‘매주 기사 하나를 내려면 일주일 분의 취재와 마감을 반복하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다. 일주일은 정말 짧고도 긴 시간이다. 일주일이 가진 힘을 새삼 깨달은 것은 기자가 위클리한양의 기사를 맡은 후부터다. 매주 한양인을 만나고, 한양인의 이야기를 쓰고, 송고된 한양인의 기사를 검토하는 것도 벌써 1년이 넘었다. 기자는 취재팀장으로서 대부분 ‘한양의 동문’에 대한 기사를 많이 다룬지라, 운이 좋게도 사회에서 성공한 자랑스러운 한양인들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이와 함께 기자 스스로도 한양의 능동적인 주체임을 깨닫고, 한양인임을 자랑스러워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특히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 전문의 유종윤 동문(2007년 8월 2주)을 만났던 기억이 오래 남는다. 유 동문은 재활의학 전문의이자 자신 또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다. 유 동문의 불편한 몸이 먼저 눈에 들어오자, 기자는 취재하러 온 것부터 죄송스러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내 인생은 특별하지 않으며, 전혀 힘들지 않았다”는 대답을 반복했다. 그에겐 기구한 ‘운명의 장난’속에 피어난 ‘인간승리’이기 이전에, ‘천직’을 위한 ‘소명’이 있을 뿐이었다. 작은 일에도 금방 포기하고 좌절하는 현대인들에게 유 동문의 존재는 ‘역할모델’ 그 이상이었다. 기자 또한 자신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계획해 나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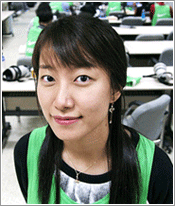 유 동문도 그랬듯, 성공한 한양인을 만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몇 번씩 퇴짜를 맞아도 ‘불굴의 의지’로 계속 부탁을 드렸고, 정성(?)에 감복한 분들은 바쁜 시간을 쪼개 취재를 응해주셨다. 그렇기에 지각은 절대 금물. ‘시간이 금’인 분들에게 그것은 결례였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기자가 지휘하는 것이 아니기에 가끔은 1, 2분의 사투를 벌이기도 했다. 지하철 환승 출구를 외우고, 눈에 보이는 택시에 냉큼 올라타서 다급히 목적지를 부르고, 교통체증이면 얼른 내려 튼튼한 두 다리로 내달렸던 것. 도착해보면 취재원의 바쁜 업무로 인해 취재 시간이 미뤄지는 경우가 많아, 겨우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얻곤 했다. 총동문회장 김진열 동문(2007년 8월 1주)을 만나러 갔을 땐, 시간에 맞게 도착했다 싶었는데 이미 40여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누군가와의 약속을 위해 한참 전부터 준비한다는 그의 말은 기자 생활을 하는 내내 마음속 깊이 박혀 있게 됐다.
유 동문도 그랬듯, 성공한 한양인을 만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몇 번씩 퇴짜를 맞아도 ‘불굴의 의지’로 계속 부탁을 드렸고, 정성(?)에 감복한 분들은 바쁜 시간을 쪼개 취재를 응해주셨다. 그렇기에 지각은 절대 금물. ‘시간이 금’인 분들에게 그것은 결례였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기자가 지휘하는 것이 아니기에 가끔은 1, 2분의 사투를 벌이기도 했다. 지하철 환승 출구를 외우고, 눈에 보이는 택시에 냉큼 올라타서 다급히 목적지를 부르고, 교통체증이면 얼른 내려 튼튼한 두 다리로 내달렸던 것. 도착해보면 취재원의 바쁜 업무로 인해 취재 시간이 미뤄지는 경우가 많아, 겨우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얻곤 했다. 총동문회장 김진열 동문(2007년 8월 1주)을 만나러 갔을 땐, 시간에 맞게 도착했다 싶었는데 이미 40여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누군가와의 약속을 위해 한참 전부터 준비한다는 그의 말은 기자 생활을 하는 내내 마음속 깊이 박혀 있게 됐다.무엇보다 교수와 동문이 기자를 ‘아끼는 후배’를 대하듯 취재에 응해주셔서 감사했던 마음이 앞선다. 구리병원장 김영호 교수(2007년 4월 2주)를 만나러 갔을 땐, 기자는 취재팀장이 아닌 사진기자였다. 그리 넓지 않은 진료실에서 취재를 진행하다보니, 사진 촬영하던 기자가 여기저기 의료기구에 몸을 부딪치기 일쑤였다. 김 교수는 “병원에 와서 취재하다가 도리어 입원할라”라며 걱정해주셨다. 그가 지녔던 따뜻한 웃음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탓에, 아직까지도 스스로 기자의 미숙함을 탓하고 있다. 사진기자의 고충은 취재기자의 그것과는 별개다. 기자는 권성준 교수(2007년 5월 4주)를 취재하러 두 번을 찾아갔다. 마감을 앞두고 찍은 사진을 모두 날려버렸던 것. 메모리카드 복구 등은 생각도 못했던 지라, 다시 양해를 구하고 촬영해야 했다. 권 교수는 회의 중간에 약 5분의 귀중한 시간을 내줬고, “다시 올 줄 알았다”며 너그럽게 웃어줬다.
‘인생의 스승’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마음에 담긴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기자에겐 큰 행운이었다. 행자부 정부혁신본부장 정남준 동문(2007년 6월 3주)은 “술 한 잔 사겠다”던 작은 약속을 잊지 않았던 분 중 한 명.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 기자들과 저녁을 함께 하고, 술 한 잔에 대학시절의 추억을 맛있는 안주로 풀어놓았다. 기자가 라이브 가수에게 신청한 ‘비오는 거리’는 정 동문의 추억 속 장소를 여름밤 비와 함께 운치 있게 젖어 들게 했다. 평소 상상하지 못했던 취재원들의 모습은 기자를 웃기기도 울리기도 했다. 이정화 동문(2007년 10월 1주)은 취재 도중 눈물을 흘렸다. 가족과 멀리 떨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과 일을 지탱해주는 교수님이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됐다는 말을 하던 중이었다. 평소 밝고 쾌활한 모습만을 보여주던 분이라 갑작스럽기도 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이 그대로 기자에게 전달돼 코가 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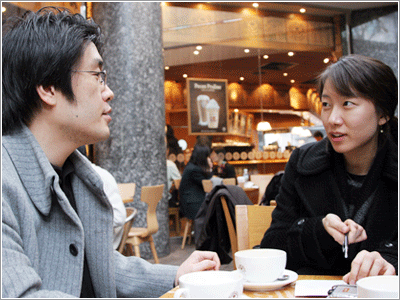 같은 한양인으로서 꿈을 찾아가는 모습에 어깨가 든든했던 일도 있었다. 퓨전 가야금 가수 정민아 동문(2007년 1월 3주)은 특별한 음악 색깔로 주목받는 신인이었다. 화려한 입담과 시원시원한 그의 성격에 반한 기자는 정 동문의 앨범을 모두 찾아 하루 종일 감상했다. 가끔 광고 등에 배경음악으로 깔리거나 TV에 인터뷰로 그의 얼굴이 나오기라도 하면 얼마나 뿌듯했었는지 모른다. 월트 디즈니 컴패니 코리아 이사 강신봉 동문(2008년 1월 2주)과의 만남은 ‘꿈과 희망을 키웠던’ 시간이었다. 평소 관심이 있었던 분야의 선배와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받았던 일석이조의 효과를 봤다. 강 동문은 “사회인이 되면 장기간 휴가를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대학 때 약 70일간의 휴가가 8번이나 주어지는데, 그 소중한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미 졸업을 코앞에 둔 기자 역시도 매우 공감하는 바였다.
같은 한양인으로서 꿈을 찾아가는 모습에 어깨가 든든했던 일도 있었다. 퓨전 가야금 가수 정민아 동문(2007년 1월 3주)은 특별한 음악 색깔로 주목받는 신인이었다. 화려한 입담과 시원시원한 그의 성격에 반한 기자는 정 동문의 앨범을 모두 찾아 하루 종일 감상했다. 가끔 광고 등에 배경음악으로 깔리거나 TV에 인터뷰로 그의 얼굴이 나오기라도 하면 얼마나 뿌듯했었는지 모른다. 월트 디즈니 컴패니 코리아 이사 강신봉 동문(2008년 1월 2주)과의 만남은 ‘꿈과 희망을 키웠던’ 시간이었다. 평소 관심이 있었던 분야의 선배와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받았던 일석이조의 효과를 봤다. 강 동문은 “사회인이 되면 장기간 휴가를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대학 때 약 70일간의 휴가가 8번이나 주어지는데, 그 소중한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미 졸업을 코앞에 둔 기자 역시도 매우 공감하는 바였다.수많은 일주일을 담아내기엔 이 역시도 부족한 공간이다. 한양인으로 위클리한양을 통해 한양인을 만나고 담아내는 일주일이 기자에겐 너무나 소중한 순간이었음을 다시금 깨닫는다. 비록 졸업으로 더 이상 마감의 긴장과 쾌감을 맛볼 순 없지만, 매주 전자우편으로 전송되는 위클리한양 소식을 읽으며 한양인의 맥박이 오늘도 힘차게 뛰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며칠 전 새벽에 접한 고 김연준 설립자의 별세 소식에 급히 커버스토리를 작성하며, 한양의 역동적인 흐름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해 끝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 생동하는 혈류가 기자에게도 영원히 흐를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자랑스러운 한양인으로서 하나의 혈맥이 될 것 또한 다짐하며 이 글을 맺는다.
한소라 취재팀장 kubjil@hanyang.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