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 년간의 삶과 연구를 정리한 산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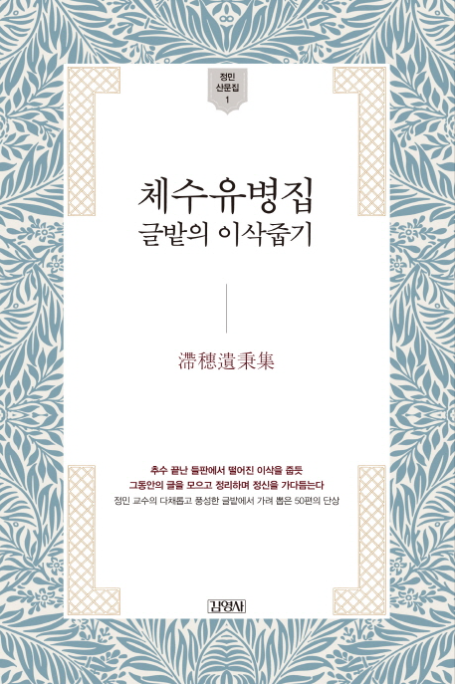
정민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신간 『체수유병집-글밭의 이삭줍기』를 출간했다.
옛 문헌에서 전통의 가치와 멋을 현대의 언어로 되살려온 정민 교수가 지난 10여 년간의 삶과 연구를 정리한 산문집이다.
'체수'(滯穗)는 낙수, '유병'(遺秉)은 논바닥에 남은 벼이삭. 즉 나락줍기라는 뜻이다. 『체수유병집』은 추수 끝난 들판에서 여기저기 떨어진 볏단과 흘린 이삭을 줍듯 수십 권의 책을 펴내면서 미처 담아내지 못한 이야기 50편을 모아 한 권으로 엮었다.
정 교수는 고전의 본질을 비추기 위해 지난 10년간 다양한 사람과 고전을 접하며 느낀 바를 『체수유병집』에 모았다. ‘추수하고 남은 이삭’을 의미하는 제목처럼 정 교수는 일상 속 사유의 흔적을 알뜰히 모은다. “한국 사람들은 왜 김치를 좋아해요?”, “한국 대학생들은 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셔요?”라는 대만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며 문화가 가진 힘을 떠올린다. 수업시간 학생들과 함께 정약용이 제자에게 남긴 글을 읽은 경험은 정약용의 사상을 넘어 교육학과 심리학까지 이어진다.
이 책은 특히 정약용과 박지원의 정신에 주목한다. 정약용은 폐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었던 18년의 귀양생활 동안 500권에 가까운 책을 썼다. 박지원은 답답한 조선을 벗어나 열하로 가는 길에 드넓은 요동벌판을 보고 ‘한바탕 울 만한 곳’이라고 말한다. 넓은 세상을 보고 온 소회는 《열하일기》의 풍자와 해학 속에 날카로운 칼처럼 숨어 있다. 정약용을 귀양 보냈던 당파 싸움과 박지원을 흔들었던 급박한 국제 정세는 지금도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다.
정 교수는 반복되는 역사와 인간의 삶에서 수단이 아닌 본질로서 고전의 역할을 논하려 했다. 또 변화의 시대에 맞춰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옛것 혹은 고전이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 교수의 탁견이 담겼다.
『체수유병집-글밭의 이삭줍기』
정민 / 2018-12-28 / 김영사 / 1만3천8백원. 280쪽


 '한양위키' 키워드 보기
'한양위키' 키워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