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한대신문 문예상 대상자 김준성(국어국문학과 4), 이동원(경제학부 3) 씨
누구나 한번은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이야기를 글로 표출하고 싶은 욕구를 느껴봤을 것이다. 스마트폰 키패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분주한 요즘, 아직까지 펜을 쥐고 빈 종이에 사유를 채워가는 두 청년이 있다. 제49회 한대신문 문예상에서 비평과 시 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준성(국어국문학과 4), 이동원(경제학부 3) 씨다. 지난 12월 16일 두 사람을 만났다.
자신만의 진정성이 드러난 작품
한대신문 문예상은 ‘새 기틀을 수립함과 아울러 유능한 문학도와 연구하는 학생을 발굴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1967년부터 매해 개최되는 문예 공모전이다. 올해엔 시, 소설, 비평 분야에 출품된 총 50개의 작품 중 5개의 작품이 최종 당선됐다. 비평 부문에서는 <정신분석과 여성-‘욕망’은 어떻게 여성을 타자화했는가>를 쓴 김준성(국어국문학과 4) 씨가, 시 부문에서는 <소금 만드는 노인>을 출품한 이동원(경제학부 3) 씨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비평 부문 심사를 맡은 이재복 교수(한국언어문학과)는 대상작인 <정신분석과 여성>에 대해 “‘여성’혹은 ‘여성성’에 대한 하나의 일관된 논리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비평적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며 “특히 어떤 대상이나 주제를 자신만의 논리로 해석하려는 태도를 높이 샀다”는 심사평을 전했다. 시 부문 심사를 맡은 유성호 교수(국어국문학과)는 시 대상작인 <소금 만드는 노인>에 대해 “형상화와 주제 의식에서 남다른 성취를 보이고 있다”며 “‘소금벌레’와 ‘노인’의 상호적 이미지들이 느리고도 아득하게 삶의 진정성을 잘 보여주었다”고 평했다.

대상작에 담긴 이야기
Q.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대상을 받은 소감이 어떠신가요.
김준성(이하 준성): 정신분석과 여성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1학기에 들었던 ‘미디어로 읽는 여성사’ 강의를 통해 이 글을 쓰게 됐어요. 생각을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문수현 교수님과 학우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동원(이하 동원): 당선 소식을 들었을 때, 오랫동안 잊고 지내왔던 ‘작가’라는 꿈 위에 뚜렷한 발자국을 하나 새긴 것 같아 기뻤습니다. 혼자만의 즐거움에 빠져서 쓴 글이었는데, 대상으로 선정돼 감사한 마음이 커요.
Q. 작품에 어떤 내용을 담고자 했나요.
준성: 국어국문학과에서 정신분석학자들의 철학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이 주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정신분석학에 여성차별적 시각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고, 여성주의적인 면에는 무엇이 있을지 찾아서 밝혀보고자 했습니다.
동원: 염전에서 소금을 만드는 한 남자의 삶을 보여주는 TV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뙤약볕에서 고무래 같은 것을 끌고 다니는 노인의 반복적인 행동이 늙어가는 노인의 삶 자체와 닮았다고 생각해서, 그 내용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Q. 본인의 작품에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 있다면?
준성: 정신분석학은 결국 자본주의와 연결돼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결말 부분에 그 내용을 서술해 내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고, 가장 맘에 드는 부분이기도 해요. (김준성 씨의 수상작 <정신분석과 여성-‘욕망’은 어떻게 여성을 타자화했는가> 읽기)
동원: 첫 번째 연의 1행 '오늘도 소금벌레는 염전을 파먹는다'란 부분이요. 소금 만드는 노인을 소금벌레로 묘사했는데, 그 비유가 꽤 괜찮았다고 생각해요(웃음). 연약한 노인이 힘겹게 일하는 모습이 얇은 팔다리로 물 위에 떠있는 소금벌레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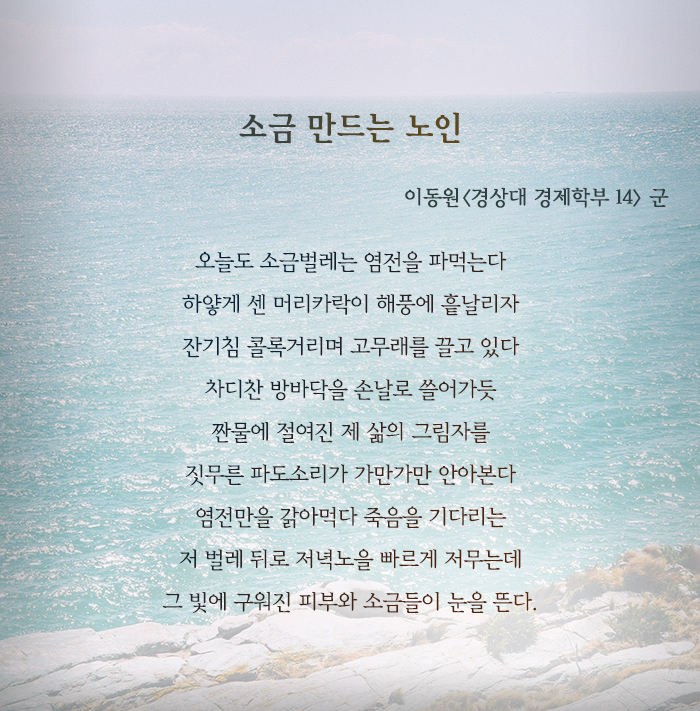
Q. 글쓰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준성: 고등학생 때부터였어요. 학교, 학원에 치이며 억압을 받고 있단 느낌을 늘 받았죠.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소설을 쓰게 됐고, 결국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하게 됐어요. 학과에서는 창작보다 비평을 주로 배우고 있어서, 비평에 흥미를 느끼게 됐어요.
동원: 어렸을 때부터 글을 쓰면 선생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자연스레 흥미가 생겼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백일장에 많이 참가했는데, 1년 정도 낙선만 하다가 우연히 작은 상을 하나 받은 적이 있어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그때부터 일상 속에서 시를 계속 쓰고 있어요.
Q. 글의 영감은 어디서 얻고, 어떻게 구체화 시키나요.
준성: 주로 다른 책을 읽다가 '여기에 이런 생각을 덧붙여서 비평을 쓰고 싶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세 달에 한 번 정도?(웃음). 그때부터 친구들과 토론을 하거나 교수님께 자문을 구하면서 생각을 정리해 글을 완성시키고요. 글 쓰는 과정에서 이론 공부를 더 하니까, 저만의 주장도 자연스럽게 나와요. 평소에 글을 많이 읽고 쓰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글쓰기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동원: 아침에 갑자기 눈이 내릴 때나 수업이 끝나고 기숙사에 홀로 있을 때처럼, 잔잔한 일상 속에서 받은 느낌을 짧은 메모나 일기로 적어둬요. 그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소재가 되거든요. 시집을 자주 읽고 순우리말 사전을 틈틈이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해 내는 것에 도움을 받기도 해요.
Q. 본인이 생각하는 글쓰기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준성: 글쓰기는 삶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4학년이라 고민이 참 많은데, 글을 쓰는 과정에서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아요. 자기 생각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동원: 사람들은 마음에 치유가 필요하거나 공감이 필요할 때 문학을 찾게 돼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효과가 가장 좋은 장르가 시라고 생각해요.
Q. 앞으로 어떤 글을 쓰고 싶나요.
준성: 국문과 대학원에 진학해 정신분석학을 더 깊게 공부하고 글을 쓰고 싶어요. 라캉이나 지젝과 같은 철학자들의 담론을 더 공부할 계획이에요. 졸업 후 어느 길을 걷게 될 진 모르겠지만, 열심히 읽고 쓰고 이야기하는 것은 평생 할 계획이에요.
동원: 지금까지는 일상 속 잔잔한 소재를 찾아 써왔는데, 앞으로는 사상을 기반으로 시를 쓰거나 사회의 문제점을 비유한 시도 쓰고 싶어요. 더 깊고 넓은 시 세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글쓰기를 업으로 삼지는 않겠지만, 도전은 계속 할 거예요. 글쓰기는 그만 두지 않고 꾸준히 계속 갖고 갈 '친구' 같은 존재예요.

글/ 신혜빈 기자 shb2033@hanyang.ac.kr
사진/ 최민주 기자 lovelymin12@hanyang.ac.kr


 '한양위키' 키워드 보기
'한양위키' 키워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