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미 교수 (체대 무용과)
오랜 옛날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춤은 생활 그 자체였다. 삼국지 위지동이전에도 나오듯이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에는 몇 날 며칠을 노래와 춤으로 지샜다. 노동과 놀이가 일체화되어 일하면서 노래하고 노래에 맞춰 춤추는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삶의 기쁨을 누렸다. 이같이 우리 전래의 춤은 흥겨운 신과 멋(신명)을 숙련된 몸짓으로 표출함으로써 춤을 추는 자나 춤을 구경하는 자 모두 신명이 넘치는 굿판을 연출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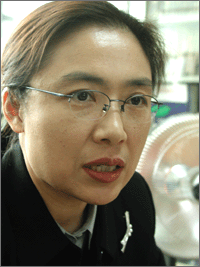 | ||
그러면 오늘날은 어떠한가? 우리도 과연 춤을 놀이처럼 즐기고 있는가? 대학에서 춤을 가르치는 나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돌이켜보면 1960년대부터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 하에서 춤은 대학의 무용학과에 들어가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다. 무용학과에 들어온 학생들은 춤의 테크닉 면에서는 숙달되었는지 모르나 자신의 생각을 몸으로 꾸며낸 것을 즐기고 노는 것이 춤의 진정한 속성이라는 것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다.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춤이란 어린 시절 부모 앞에서 재롱으로 보여줬던 그 때의 즐거움이 마지막 추억처럼 남겨져 있을 뿐, 따라하기 힘든 몸의 움직임 정도로만 생각해 왔던 것이 아닌가? 더구나 음악이나 미술은 일찍부터 독립된 학과목으로 인정되고 있었지만, 무용은 체육의 한 단원으로 명맥을 이어왔기에 춤이 신명나도록 즐거운 것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는 더더욱 없었다.
그러나 누군가 말했듯이 과도한 욕망에 사로잡힌 현대인들은 춤추는 것과 꿈꾸는 것을 다시 배우지 않으면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춤이란 인간의 욕망을 풀어내는 춤뿐만 아니라 인간의 특권인 창조의 기쁨을 즐길 수 있는 춤, 살아있는 춤을 가리킨다.
이러한 춤을 추기 위해서는 우선 호흡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 명상음악가인 김도향의 "항문을 조이고 우주를 마시자"는 노래가사를 따라하는 것도 좋은 훈련방법이다. 그는 하루에 500번씩 항문을 조이면 영혼의 숙변을 없앨 수 있어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진다고 노래한다. 인간문화재 박병천 선생님도 춤을 출 때 숨의 저장을 위해서는 재래식 화장실에서 쪼그려 앉는 자세를 권했고, 연출가인 이윤택 역시 항문호흡이 연기호흡의 첫 단계라고 말한 바 있다.
항문호흡은 무용에서도 중요하다. 특히 춤추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문명의 발달과 함께 잊혀졌던 원초적인 호흡(생명체가 지니고 있는 원래의 에너지, 속도, 유연성과 민첩성을 유지하기 위한 호흡)이 습관화되어야 한다. 자기만의 춤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힘이 드는 법이다.
호흡이 익혀지면 이제 함께 생각하는 춤을 추어야 한다. 아니 함께 꿈을 꾸며 춤을 출 수 있는 마당을 무용가들이 마련해내야 한다. 사실 그 동안 관객과 함께 하는 춤을 지향해오긴 하였지만 실제로는 보여지는 춤에 그친 점이 없지 않다. 무용수들의 몸짓과 그들이 내뿜는 숨소리가 웅대한 무대장치와 화려한 조명에 가려지는 바람에 관객들은 그야말로 무용작품의 구경꾼 이상이 될 수 없었다. 그나마 구경꾼조차도 막대한 제작비에 비해 너무나 적은 것이 현실이다.
무용공연을 통해 반드시 무언가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잘 훈련된 무용수들의 열정적인 몸짓을 보고 관객들이 함께 흥겨워하거나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도대체 정치·사회적으로 짜증나는 일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신명을 불어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겠는가? 그러한 춤이야말로 진정으로 인간의 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무용교육현실도 개선되어야 한다. 어린 시절의 재능을 발견하여 키워주는 선생님, 일상생활에서도 새로움을 발견함으로써 삶을 즐길 줄 알도록 격려해주는 선생님을 많이 배출하는 풍토가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나는 춤의 생명을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하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사랑의 실천을 위해 행당 언덕을 오르내리는 한양인들과 진정한 인간의 춤을 추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