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법 연구하는 국내 최초 의사 출신 변호사
"법적 규율 없이 이뤄지는 인간 복제 연구 문제"
 | ||
최근 유럽에서 '안락사'를 둘러싸고 다시금 논쟁의 불씨가 지펴지고 있다. MND라는 희귀한 운동신경질환으로 전신이 마비된 영국의 한 여성이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자국법에 맞서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보장하라'며 유럽 인권재판소에 안락사 허용을 요청하는 한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네티즌들에게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인권재판소 측은 만장일치로 '자살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해 일단 기존의 안락사 불허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논란을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일부 병원에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나 가족이 심폐소생술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돼 해당 정부부서에서 현행법 저촉여부 검토를 시사하는 등 의료윤리와 생명의료법 등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국내 최초 의사 출신 법학자인 법대 정규원(법학) 교수를 만나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최근 안락사 등 의료윤리에 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데
얼마전 모 병원에서 생존 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한 환자를 환자 보호자의 동의 하에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안락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의미한 치료에 대한 의료법이 정비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한 사건이다. 미국이나 영국은 이러한 환자에 대한 치료 계속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정비할 수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의료 관련 법규가 제정될 당시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짜깁기한 탓에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의약분업을 놓고 벌인 갈등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지 않았나. 의료분쟁도 끊이질 않는 상황이다.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등 기본 원칙에서부터 정비가 시급하다.
인간 복제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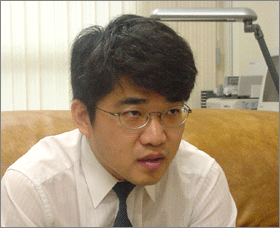 | ||
물론 인간 배아 복제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희귀 질환 치료에 가능성을 여는 등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 규율이 미비한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인간 복제 연구는 분명 문제가 있다. 생명공학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과학 기술의 발전이라는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이것이 미칠 사회적 파장과 윤리적인 측면은 간과하는 편이다. 따라서 인간 배아의 법적 지위를 비롯해 유전정보 문제 등 생명공학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포괄하는 생명의료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는 이미 의료법(medical law)이 생명의료법(biomedical law)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생명의료법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가
이미 의료법의 독립적인 학문분야로 발전한 미국에 비해 우리는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서구의 의료법은 의학분야와 법학분야가 개별적인 수준에서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다. 비록 미약하기는 하지만 일부 국내 대학에서 법무대학원내에 의료법 관련 커리큘럼을 포함시키거나 의대에 의료윤리학과 등을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론적 체계가 부족하고 방향성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인들의 윤리가 의학기술의 발전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 ||
의료인들의 윤리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고 본다. 전문인인 만큼 의료인 자신이 해결해야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사회의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의료분쟁을 둘러싼 소송이 늘어나면 병원은 존립 자체가 힘들어진다. 대학에서 미리 의료인들에게 윤리교육을 강화해야한다. 이제는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시대이다. 그러나 인문사회과학이 뒷받침되지 않는 과학기술은 매우 위험하다. 이는 의료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도적인 지원도 뒤따라야한다. 선진국에서는 생명공학분야 프로젝트의 연구비에서 3∼5%는 인문사회부문에 재투자한다고 한다. 부러운 현실이다.
법대 교수였던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지만 지난 91년 인턴 시절, 수술 후 숨진 아이의 사망원인을 놓고 보호자와 의사간에 벌어진 의료분쟁을 경험한 것이 계기가 되어 법학자의 길로 들어섰다는 정 교수는 현재 법대에서 형법을 강의하고 있다. 흰 가운이 더 어울릴 듯한 가냘픈 체구의 정 교수가 정비가 시급한 의료법에 '메스'를 대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용석 학생기자 antacamp@ihanyang.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