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교수(스포츠산업학과)
|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인 스포츠는 단연 ‘축구’다. 국가대항전에서 골이 터지면 함성소리가 온 동네 전체를 뒤덮고, 다음 날 스포츠뉴스 1면을 단번에 차지해버린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2002년 한일월드컵의 붉은 기운을 기억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축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왜 프로축구는 프로야구만큼의 인기를 구가하지 못하는지, 남북한 축구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이에 대한 답을 적은 학술서적을 최근 출간한 이종성 교수(스포츠산업학과)를 만났다. |
스포츠 기자에서 영국 유학생으로
이종성 교수는 어떻게 남북한 축구사에 대해 연구하게 됐을까. 이 교수는 어릴 적부터 스포츠를 정말 좋아했고, 스포츠기자를 하고 싶은 꿈이 생겼다. 기자로서 스포츠 경기를 취재할 때 본인의 장점이 가장 돋보일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교수는 한 인터넷매체에서 5년 간 스포츠 기자로 활동했다. 하지만 그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회상했다. “우리나라가 아직 ‘스포츠 역사’ 부분의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 외신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국내에서 고급 정보를 듣는 경로도 많이 한정돼 있었죠. 무엇보다도 기자의 자질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일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친화력이나 분석력 등을 통해서 스스로 새로운 뉴스를 발굴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느꼈어요.”
이 교수는 스포츠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고자 유학을 택했다. 2006년 독일월드컵 현지 취재를 마친 뒤 같은 해 9월 곧바로 영국 드몽포트대학교 석사과정에 입학했다. 석사 논문은 한국 야구의 발전에 대한 주제였으나, 축구팬이셨던 부친의 영향으로 박사 논문은 ‘남북한 축구사’로 방향을 돌렸다. 남북한이라는 분단된 환경에서 축구역사를 다룬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드물었다는 점에 주목한 것. 1966년 북한이 8강 진출이라는 결과를 냈던 잉글랜드 월드컵은 FIFA의 변화를 이끈 월드컵이다. 영국에 북한 축구 관련 자료가 많은 것 또한 박사 논문의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 논문이 최근 책으로 출간됐다. ‘남북한 축구사 1910년부터 2002년까지: 발전과 확산(A History of Football in North and South Korea c. 1910-2002 Development and Diffusion)’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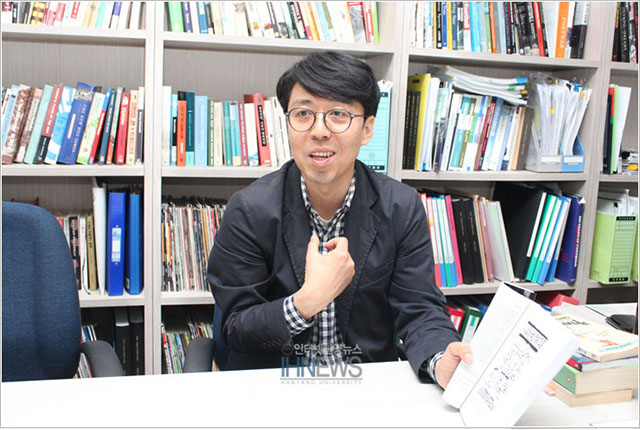 | ||
| ▲ 스포츠를 좋아했던 이종성 교수(스포츠산업학과)는 기자를 시작으로 스포츠계에 뛰어들었다. | ||
남북한 축구사, 일제강점기부터 2002년까지
 | ||
| ▲ 남북한 축구사를 다룬 이종성 교수의 책 표지. 박지성 선수는 남북한 플레이 스타일의 총 집합체다. (출처: 피터랑(peterlang) | ||
이 교수의 박사 논문은 유럽의 학술서 전문 출판사인 피터 랭(Peter Lang)의 권유로 세상에 나오게 됐다. 다소 생소하고 드문 주제인 남북한 축구사를 출판사가 눈 여겨본 덕이다. 이 교수는 스포츠 문화나 스포츠 역사에 관한 책이라면 학술서와 대중서의 경계를 허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외국인이 한국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되리란 생각에 권유를 승낙했다고. 1년 6개월 동안 학위논문을 대폭 보강해 펴낸 이 책은 총 다섯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일제강점기와, 1966년 월드컵, 2002년 월드컵의 세 시기를 집중 탐구한다. 축구가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일제강점기부터, 이 교수가 역사적인 평가가 가능한 시점이라 판단한 2002년까지의 남북한 축구 이야기다.
제1장은 일제강점기의 조선 축구를 다룬다. 이 교수는 “을사늑약이 체결된 1910년부터 조선 축구가 공식적으로 대중 속에 퍼졌다”고 했다. “당시 경성과 평양은 조선 축구의 두 축이었습니다. 독립을 갈망하는 대중들의 열망이 축구의 인기에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죠. 당시 대지주 계급들은 계몽이나 독립운동을 하는데 축구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후원자를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1945년부터 1964년은 남한 축구에 있어 ‘격동의 시간’이었다. 반면, 북한은 축구 훈련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갔던 시기이기도. 이를 통해 북한은 3장에서 소개되는 1995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8강이라는 쾌거를 올린다.
4장에서는 1974년부터 1991년까지 남한 축구의 부활을 그린다. 남북한은 197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무승부를 기록했고, 한국 축구는 자신감을 되찾는다. 이 시기는 남한이 경제적으로 북한을 완전히 추월한 때이기도 하다. 2002년 월드컵은 5장에 등장한다. 북한은 당시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의 경기를 중계했다. 이 교수는 이 중계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라 말했다. 북한 정권의 안정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다. 북한이 40년 전인 1966년에 이긴 이탈리아를, 한국은 2002년에야 비로소 이겼다는 것을 선전하는 효과를 노렸단 것이다. 동시에 한국보다 높은 경제 수준을 구가했던 당시의 영광을 그리워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평가다.
민족적 동질성을 숨길 순 없다
 | ||
| ▲ 일제감정기 당시 일본과 조선의 축구 경기를 다룬 그림. 이종성 교수는 이 그림을 통해 한국 축구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했다. | ||
이 교수가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결말은 남북한의 플레이 스타일이다. “남북한은 오랜 분단으로 인해 이념 체제도 다르고 문화생활을 영위한 정도에도 차이가 많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1966년 북한이 보여준 경기와 2002년 한국이 펼친 경기는 플레이 스타일 면에서 많이 비슷합니다. 남북한 축구의 플레이 스타일의 총 집합체는 책 표지에 나타난 박지성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축구 기술이 앞선 것은 아니었지만 근면성을 내걸고 열심히 뛰는 스타일이란 것이죠.” 실제로 외국 언론의 평가도 이와 같다. 세련미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인 플레이 스타일에서는 민족적인 동질성이 보인다는 의미다.
이처럼 각 시기마다 스포츠가 어떻게 발전했으며, 나라마다 발전 속도나 방향이 왜 비슷하거나 다른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스포츠 문화사’의 영역이다. 우리는 ‘스포츠 문화사’적으로 어떤 전략을 펼칠 수 있을까. 이 교수는 ‘축구 외교’가 그 답이라고 했다. 북한이 국제무대로 나오려고 할 때, 축구를 통해 남북한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 남북한 교류에 있어 스포츠 문화사적 접근은 이 교수 개인의 연구 분야임과 동시에 한국이 탐구해야 할 과제일지 모른다.
글/ 박윤정 기자 dbwsjd602@hanyang.ac.kr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사진/ 최민주 기자 lovelymin12@hanyang.ac.kr


 '한양위키' 키워드 보기
'한양위키' 키워드 보기